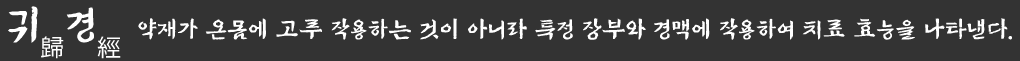각기병(脚氣病) : 비타민 B1의 결핍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 쌀을 주식으로 하는 지방의 주민사이에 많이 발생한다. 주요증상은 다발성신경염에 의한 말초신경증상, 심근섬유의 변성에 따른 심장의 비대나 확장등의 순환기 증상이다. 인스턴트면류의 유행으로 1973년 무렵 일본에서 다시 발생했다. 이러한 것은 비타민 B1투여로 두드러지게 감소된다.
각혈(咯血) : 기도를 통해 나오는 출혈. 옛 의학서에는 객혈에 대하여 기침과 함께 피가 나오는 것을 해혈(咳血), 기침 없이 피가래를 뱉는 것을 수혈(嗽血)로 보았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뜻으로 객혈 또는 해혈(咳血)로 쓰고 있다. 음정(陰精)이 부족하여 화사(火邪)가 성하거나 폐(肺)에 조열사(燥熱邪)가 있을 때, 기타 외상에 의해서 생긴다. 목구멍에서 피비린내가 나면서 기침과 함께 거품 섞인 피가래나 핏덩어리가 나오는 데 그 빛깔은 빨갛다. 또는, 기침이 없이 새빨간 피나 핏덩어리가 나오는 때도 있다. 자음강화(滋陰降火)하는 방법으로 사삼맥문동탕(沙參麥門冬湯)이나 육미지황탕(六味地黃湯)에 천근산(茜根散)을 가감하여 쓴다.
폐결핵, 기관지 확장증, 폐울혈(肺鬱血), 출혈성 자반병 등에서 볼 수 있다.
간비종대(肝脾腫大) : 간비장(肝脾臟)이 붓고 커진 병증.
간풍(肝風) : 병이 경과하는 과정에 몸이 떨리고 어지러우며 경련이 이는 등 풍(風)이 동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 외풍(外風)과 구별하기 위하여 간풍내동(肝風內動)이라고도 한다. 열이 몹시 성하거나 음혈(陰血)이 부족해서 생긴다. 옛 의학서에 모든 풍증(風證)은 간(肝)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어지럽고 떨리며 경련이 일고 이명(耳鳴)이 있으며 사지 마비 등 증상이 있다. 원인에 따라 여러 가지 식풍법(熄風法)으로 치료한다.
간풍내동(肝風內動) : 풍(風)이 동하여 현훈(眩暈), 추휵(抽搐), 요동(搖動)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함. 외감풍사(外感風邪)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모두 간풍내동에 속한다. 허증과 실증의 구분이 있는데, 허증은 허풍내동(虛風內動)이라 하고, 실증은 열성동풍(熱盛動風)이라 한다.
감적(疳積) : 음식을 조절하지 못하여 비위(脾胃)가 상하거나 습열(濕熱)이 몰려서 생긴 감질(疳疾)의 기본 병.
감비건미(減肥建美) : 덜 감, 살찔 비, 세울 건, 아름다울 미
강심이뇨(强心利尿) : 강할 강, 마음 심, 이로울 이, 오줌 뇨
강지항암(降脂亢癌) : 내릴 강, 기름 지, 높을-목구멍 항, 암 암
개위(開胃) : 위의 소화기능을 돕고 식욕을 돋우는 방법
거담지해(去痰止咳) : 담을 없애고, 기침을 멈추게 함.
거풍통락(祛風通絡) : 풍사로 생긴 병을 물리쳐서 경락에 기가 잘 통하게 함.
건비익기(健脾益氣) :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기(氣)를 더하는 효능
건위(健胃) : 위를 튼튼하게 하여 소화기능을 높이기 위한 처방
결흉(結胸) : 사기가 가슴속에 몰려서 명치 밑이 그득하고 아프며 만지면 단단한 감이 있는 증. 흔히 태양병(太陽病) 때 너무 일찍이 설사시켜서 표열(表熱)이 속으로 들어가 가슴속의 수음(水飮)과 합쳐져서 생기거나 태양병이 양명병(陽明病)으로 전이되어 양명실열(陽明實熱)이 뱃속의 수음과 결합해서 생긴다. 결흉은 원인과 증상에 따라 대결흉(大結胸) · 소결흉(小結胸) · 열실결흉(熱實結胸) · 한실결흉(寒實結胸) · 수결흉(水結胸) · 혈결흉(血結胸) 등으로 나눈다.
경중한열통(莖中寒熱痛) : 음경(陰莖)에 한열(寒熱)이 왕래(往來)하면서 아픈 병증.
고환종통(睾丸腫痛) : 고환(睾丸)이 붓고 통증이 있는 것
골증(骨蒸) :오증(五蒸)의 하나. 열이 골수(骨髓)로부터 증발되어 나오는 것을 말함. 이십삼증(二十三蒸)의 하나이기도 하다. 골증에는 항상 도한(盜汗), 유정(遺精), 몽교(夢交), 월경불순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외대비요(外臺秘要)] 제13권에서 "골수에서 열이 나는 것을 골증(骨蒸)이라고 한다.(骨髓中熱, 稱爲骨蒸)"라고 하였다.
노채(癆瘵). [잡병광요(雜病廣要)] <골증(骨蒸)>에서 "골증은 후세의 이른바 노채(癆瘵)이다.(骨蒸卽後世所稱癆瘵是也.)"라고 하였다.
관중(寬中) : 중초(中焦)를 편안하게 한다는 말.
관흉이기(寬胸利氣) : 가슴을 편안하게 하고 기(氣)를 이롭게 하는 치료방법.
귀경(歸經) : 한약 약성 이론의 하나. 한의학에서는 사람에게 한약을 쓰면 그것이 온 몸에 고루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장부와 경맥이 있다고 보고 그것을 귀경이라고 하였다. 한약의 귀경은 임상 경험에 기초하여 어느 한약은 어느 장부와 경맥의 병증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치료 효능을 나타내는가 하는 것을 보아 규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길경(桔梗) · 행인(杏仁) 등과 같이 기침과 숨이 찬 증상을 치료하는 한약은 폐경(肺經)에, 은주(銀朱) · 산조인(酸棗仁)과 같이 두근거림(palpitation) · 불면증 등 증상을 치료하는 한약은 심경(心經)에, 구인(蚯蚓) · 오공(蜈蚣)과 같이 경련을 치료하는 한약은 간경(肝經)에 작용한다고 보았다.
또한 한약의 선택 작용은 맛과 일정한 관계를 가진다고 보았다. 곧 신맛을 가진 한약은 간경(肝經) · 담경(膽經) · 심포경(心包經) · 삼초경(三焦經)에, 쓴맛을 가진 한약은 심경(心經) · 소장경(小腸經) · 심포경(心包經) · 삼초경(三焦經)에, 단맛을 가진 한약은 비경(脾經) · 위경(胃經)에, 매운맛을 가진 한약은 폐경(肺經) · 대장경(大腸經)에, 짠맛을 가진 한약은 신경(腎經) · 방광경(膀胱經)에 작용한다고 보았다. 옛 의학서에는 매개 한약의 귀경이 밝혀져 있다. 일정한 장부와 경맥의 병증을 치료할 때에는 해당 장부와 경맥에 작용하는 한약을 주약으로 쓰고 장애된 장부, 경맥과 밀접히 연관된 장부와 경맥에 작용하는 한약을 보조약으로 배합해 쓴다.
규폐증(硅肺症) : 규산이 들어있는 먼지가 폐에 쌓이면 규산의 기계적·화학적 작용에 의해 폐에 염증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생긴 염증은 결국 폐에 상처를 남기게 되고, 시간이 지나며 결국 폐가 온몸에 산소를 공급하는데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만성질환을 규폐증이라고 한다.
금창(金瘡) : 달리 금상(金傷) · 금인상(金刃傷)이라고도 함. 쇠붙이에 상한 창상(創傷). 금창이 경하면 피부나 근육이 손상되고 아프며 피가 나온다. 심하면 근육이나 내장까지 상한다. 피가 지나치게 나면 얼굴이 창백해지고 현기증이 나며 맥박 상태가 미세(微細)한 것 등 허탈 증상이 생긴다. 지혈 목적으로 현삼(玄參) · 천초근(茜草根) · 영인진(鈴茵陳) · 대황(大黃) · 황금(黃芩) · 황백(黃柏) · 빙편 (冰片) · 오배자(五倍子)를 쓰면서 창상이 깨끗하면 꿰매고 창상이 지저분하면 여성금도산[如聖金刀散: 송향(松香) · 백반(白礬) · 고백반(枯白礬)]을 뿌려 준다. 근육이나 내장이 상하면 수술을 하여야 한다.
기리(氣痢) : 이질의 하나. 원기가 부족하여 중기(中氣)가 아래로 처지거나 몰려서 생긴다. 기허(氣虛)로 생긴 때는 심한 설사를 하고 배가 더부룩하게 불러오르며 방귀가 자주 나온다. 온삽고탈(溫澀固脫)하는 방법으로 가려륵환(訶黎勒丸)을 쓴다. 기가 몰려서 생긴 때는 거품이 섞인 대변을 설사하고 뒤가 무직하며 배가 더부룩하게 불러오르고 대변볼 때 방귀가 많이 나오며 역한 냄새가 나고 때로 배가 끓으며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 이기도체(理氣導滯)시키는 방법으로 유기음자(流氣飮子)나 육마탕(六磨湯)을 쓴다.
기육(肌肉) :근육을 말한다. 옛 의학서에는 비(脾)가 온 몸의 기육을 주관하므로 기육이 튼튼한가 튼튼하지 못한가 하는 것은 비기(脾氣)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기혈체통(氣血滯痛) : 기와 혈이 막혀 아픈 증상
나력(瘰癧) : 서루(鼠瘻), 역자경(癧子頸), 경력(頸癧), 노서창(老鼠瘡) 작은 것이 나(瘰), 큰 것이 역(癧)임. 림프절에 멍울이 생긴 병증. 근심과 분노로 간화(肝火)가 막혀 담(痰)이 되어 경락에 머물렀다가 근육을 수축해 멍울이 됨. 목(頸項)과 귀 뒤, 자개미에 한두 개의 멍울이 생겨 구슬을 꿴 것처럼 이어지고, 처음에는 콩알만 하다가 점차 커져 복숭아씨 만해지고, 증한장열(憎寒壯熱), 인항강통(咽項强痛)이 있고, 누르면 움직임. 남자는 이마에 힘줄이 드러나고, 조열(潮熱)이 나고, 기침하고, 땀이 남. 부인은 눈에 핏발이 서고, 월경이 중단되고, 골증(骨蒸)과 오심번열(五心煩熱)이 있음.
납기(納氣) : 신(腎)의 기능의 하나. 들이쉰 숨을 받아들인다는 말이다. 옛 의학서에 폐(肺)는 숨을 내쉬는 것을 주관하고 신(腎)은 들이쉰 숨을 받아들이는 것을 주관한다고 했다.
냉비(冷痺) : 한(寒)의 기운으로 인해 손발에 감각이 없고 저린 증상임
단독(丹毒) : 달리 단표(丹熛) · 화단(火丹) · 천화(天火) · 금사창(金絲瘡)이라고도 일컬음. 피부가 벌겋게 되면서 화끈 달아오르고 열이 나는 병증. 주로 아랫다리와 얼굴에 잘 생긴다. 여기저기에 생기는 것을 적유단(赤遊丹), 머리에 생기는 것을 포두화단(抱頭火丹), 아랫다리에 생기는 것을 유화(流火)라고 한다. 풍열독(風熱毒) · 습열독(濕熱毒)이나 상처로 독이 침입하여 생긴다. 피부가 벌겋게 되고 경계가 뚜렷하며 건강한 피부면보다 약간 두드러지고 화끈 달면서 아프다. 때로 물집이 생기고 터지면 누런 물이나 고름이 나온다.
빨리 주위로 퍼져나가며 가까운 림프절들이 붓는다. 그리고 오슬오슬 추우며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며 입이 마른다. 심할 때는 열이 몹시 나고 안절부절못하며 의식이 장애되고 메스꺼움이 있는 등 열독(熱毒)이 성한 증상이 나타난다. 청열해독(淸熱解毒), 양혈화어(涼血化瘀)하는 방법으로 보제소독음(普濟消毒飮)을 가감하여 쓰는데 머리에 생겼을 때는 선태(蟬蛻), 허리에 생겼을 때는 용담(龍膽), 다리에 생겼을 때는 황백(黃柏) · 비해(萆薢)를 더 넣어 쓴다. 외치법으로 금황산(金黃散)을 발라 주거나 마치현(馬齒莧) 100g을 물에 달여서 찜질하거나 덖은 콩가루를 물에 개어 붙이기도 한다. 필요한 때는 항생제를 쓰는 등 양방 치료를 배합하여야 한다.
담음(痰飮) : 몸 안에 수습(水濕)이 운화되지 못하여 생긴 음(飮; 묽은 가래 또는 물가래, 찬가래)과 담(痰; 진한 가래 또는 불가래, 더운 가래)을 말함.
여러 가지 음증(飮證)과 담증(痰證)의 총칭. [제병원후론(諸病源候論)] <담음제병후(痰飮諸病候)>에서 "담음은 기맥(氣脈)이 막혀 진액이 통하지 못함으로 수음(水飮)과 기가 흉부(胸府)에 정체되어 맺혀 담이 된다.(痰飮者, 有氣脈閉塞, 津液不通, 水飮氣停在胸府, 結而成痰.)"고 하였다.
음증(陰證)의 하나. 음사(飮邪)가 장위(腸胃)에 머무름으로써 발생한다. [금궤요략(金匱要略)] <담음해수병맥증치(痰飮咳嗽病脈證治)>에서 "본래 혈기 왕성하던 사람이 바싹 여위고 수(水)가 장(腸)에서 흘러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을 담음이라 한다.(其人素盛今瘦, 水走腸間, 瀝瀝有聲, 謂之痰飮.)"고 하였다.
도체(導滯) : 치료법의 하나. 막힌 것을 통하게 하는 방법이다. 보통 음식에 체한 것을 내려가게 하는 방법을 말한다. 약으로는 후박(厚朴) · 지각(枳殼) · 지실(枳實) 등을 쓴다.
도한(盜汗) : 달리 침한(寢汗)이라고도 일컬음. 한증(汗證)의 하나. 잠잘 때에는 땀이 나다가 잠에서 깨어나면 곧 땀이 멎는 것을 말한다. 잠잘 때 나는 땀이라 하여 침한이라고도 한다. 만성병이나 심한 출혈, 열성 질병으로 음혈(陰血)이 부족해서 생긴다. 그 밖에 《동의보감(東醫寶鑑)》에는 비습(脾濕)이 성하거나 간열(肝熱)에 의해서도 생긴다고 하였다. 음정(陰精)과 혈액을 강화하고 자양하면서 허열(虛熱)을 없애는 방법으로 치료한다. 원인과 증상에 따라 음허도한(陰虛盜汗) · 혈허도한(血虛盜汗)으로 나눈다.
동통(疼痛) : 통증부위가 흉부에 있는 것은 심폐(心肺)에 속하며, 상복부에 있는 것은 위(胃), 양쪽 옆구리가 땅기면서 아픈 것은 간담(肝膽), 배꼽 주위에 통증이 있는 것은 비(脾), 대장(大腸), 소장(小腸)에 속하거나 충적(蟲積)이며, 배꼽 아래 소복(小腹)에 통증이 있는 것은 방광(膀胱), 자궁(子宮)에 속하고, 소복이 아프거나 고환이 땅기는 것은 간경(肝經)에 속한다.
두창(痘瘡) : 달리 천행두(天行痘) · 천두(天痘) · 천행발반창(天行發斑瘡)이라고도 부름. 급성 발진성 전염병의 하나. 천연두를 말한다. 옛 의학서에는 전염성이 세기 때문에 큰 전염을 일으킨다고 하여 천행두, 또는 천행발반창이라고도 하였으며 흔히 피부에 물집이 생기고 그것이 곪아 헌데로 된다고 하여 대역(大疫)이라고도 하였다. 주로 시행여기(時行癘氣)에 의하여 생긴다. 열이 나면서 재채기나 기침을 하며 하품을 자주 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면서 얼굴이 벌겋고 잘 놀라며 손발이 싸늘하고 3일 만에 온 몸에 특이한 발진이 돋는다.
라력(瘰癧) : 임파결핵과 비슷한 병
명문화(命門火) : 신정(腎精)을 기화(氣化)시켜 인체의 생명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의 근원으로, 신양(腎陽)과 같은 용어.
반위(反胃) : 음식이 내려간 지 한참 만에 거꾸로 넘어오거나 속에서 한동안 묵었다가 도로 나오는 병증. [의관(醫貫)]에 "음식을 여느 때보다 배로 먹어 모두 위(胃)로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아침에 먹은 것을 저녁에 토하고 저녁에 먹은 것을 아침에 토하거나 2, 4시간 후에 토하거나 하루 밤낮 동안 쌓여 있어 뱃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여 견디지 못하고 토하는데, 먹었던 음식물이 전혀 소화되지 않은 채로 나오면서 시큼한 냄새가 난다. 이는 이미 위(胃)로 들어갔던 것이 되돌아 나오는 것이므로 번위(翻胃)라고 한다.(飮食倍常, 盡入於胃矣, 但朝食暮吐, 暮食朝吐, 或一兩時而吐, 或積至一日一夜, 腹中脹悶不可忍而復吐, 原物酸臭不化, 此已入胃而反出, 故曰翻胃.)"라고 하였다.
[단계심법(丹溪心法)] 제3권에 "번위(翻胃)가 바로 격열인데, 격열(膈噎)은 곧 번위가 심한 것이다.(翻胃卽膈噎, 膈噎乃翻胃之漸.)"라고 하였다.
발한(發汗)해표 : 피부의 땀샘에서 땀을 분비시키고 표(表)에 있는 사기(邪氣)를 없애는 효능.
방향화습(芳香化濕) : 체내에 있는 습탁(濕濁)을 방향성이 있는 약물을 써서 치료하는 효능
백전풍(白癜風) : 달리 백박(白駁) · 백박풍(白駁風) · 백전(白癜)이라고도 부름. 피부에 흰 반점, 즉 색소탈실반이 생기는 병증을 말한다. 간기(肝氣)가 정체되고 기혈이 부족하거나 풍습사(風濕邪)가 서로 결합하여 기혈이 조화되지 못하여 생긴다. 흰 반점은 임의의 부위에 각기 다른 모양과 크기로 나타난다. 경계는 뚜렷하며 보통 자각 증상이 없고 주위 피부색은 더 진해진다. 흰 반점 안에 있는 털도 점차 희어진다. 병은 보통 매우 완만하게 경과한다. 내치법으로는 양혈활혈(養血活血), 거풍(祛風)하거나 간신(肝腎)을 튼튼하게 하는 약들을 쓴다. 단방으로는 백지(白芷) · 독활(獨活) · 보골지(補骨脂) · 자질려(刺蒺藜) · 마치현(馬齒莧) 등을 달여 먹거나 팅크제, 산제를 쓴다. 외치법으로는 보골지팅크를 바르고 일광욕을 한다. 이 밖에 이침(耳鍼), 피부침 등 침치료법도 쓴다. 일반적으로 2~3개월 이상 체계적으로 치료하여야 한다.
번열(煩熱) :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나는 증. 외감열병(外感熱病) 때 열사(熱邪)가 발산되지 못하거나 이실열증(裏實熱證) 때 속에 열이 성해서 생기거나 내상잡병(內傷雜病) 때 열이 몰리고 막혀서 생긴다. 가슴이 답답하며 열이 나는 데 열이 양명경(陽明經)에 있으면 대변이 굳어 누기 힘들고 아랫배가 그득하다. 속에 있는 열을 내리는 방법으로 인삼백호탕(人參白虎湯)을 쓴다. 양명경에 열사(熱邪)가 침범한 이실증(裏實證)이면 승기탕(承氣湯) 같은 것을 쓰고 허열(虛熱)이 진액을 많이 소모한 때는 시호사물탕(柴胡四物湯)을 쓴다.
번조(煩躁) : 가슴속이 달아오르면서 답답하고 편안치 않아서 팔다리를 가만히 두지 못하는 증상. 《의종손익(醫宗損益)》에는 번(煩)이란 속이 답답하고 토하려 하는 모양이고 조(躁)란 손발을 요동하면서 앉으나 누우나 편안치 않은 것이라 하였다. 번조는 외감(外感)과 내상(內傷)의 여러 질병 때 흔히 보인다. 일반적으로 땀이 나지 않고 설사하지 않았는데 번조 증상이 있는 것은 실증(實證)에 속하고 땀이 나고 설사한 뒤에 번조 증상이 있는 것은 허증(虛證)에 속한다.
보중익기(補中益氣) : 달리 보비익기(補脾益氣)라고도 함. 보기법(補氣法)의 하나. 중초[中焦 · 비위(脾胃)]를 강화하여 기허증(氣虛證)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비위는 기혈을 만드는 장부이기 때문에 비위를 튼튼하게 하는 것은 원기를 북돋우는 기본 방법이 된다. 예를 들면 비기(脾氣)가 허해서 팔다리에 힘이 없고 온 몸이 노곤하며 소화가 안 되고 대변이 묽고 항문이 빠져나오며 혀가 희끄무레하고 엷고 허연 설태가 끼며 맥박 상태가 유약(濡弱)한 증상이 나타날 때에 비위를 강화하는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이나 사군자탕(四君子湯)을 쓰는 것 등이다.
보폐(補肺) : 폐기를 보익하는 것과 폐음을 보양하는 것
분문(噴門) : 의학 위와 식도가 연결되는 국부(局部)
사기(邪氣) : 풍(風) · 한(寒) · 서(暑) · 습(濕) · 조(燥) · 화(火)와 여기(癘氣) 등 병을 일으키는 요인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외감병(外感病)을 일으키는 외인을 말한다. 외인(外因)이란 몸 밖으로부터 침입한 사기를 말하므로 외인을 외사(外邪)라고도 한다.
사지산통(四肢痠痛) : 사지(四肢/팔다리)가 시큰거리고 통증이 있는 것.
사화(瀉火) : 치료법의 하나. 성질이 찬 약으로 열이 심하여 생긴 화(火)를 말끔히 없애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간화(肝火)가 성하여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우며 얼굴과 눈이 붉어지고 입맛이 쓰며 성질이 조급해지고 혀의 끝과 가장자리가 붉어지고 맥박 상태가 현삭(弦數)하며 심하면 정신을 잃거나 발광하며 피를 토하는 증상이 나타날 때에 간화를 없애는 방법으로 사청환(瀉靑丸)이나 용담사간탕(龍膽瀉肝湯)을 쓰는 것 등이다.
산결소종(散結消腫) : 뭉친 것을 풀어주어 부은 종기나 상처를 치료하는 것.
산기(疝氣) : 고환(睾丸)•부고환(副睾丸)•음낭(陰囊) 등의 질환으로 일어나는 병을 통틀어 일컫는 말.
산기동통(疝氣疼痛) : 고환이나 음낭이 커지면서 아프거나 아랫배가 켕기며 아픈 병증으로 동통이 있는 것.
삼초(三焦) : 달리 외부(外府) · 고부(孤府) · 결독지관(決瀆之官) · 중독지부(中瀆之府)라고도 일컬음. 육부(六腑)의 하나. 목구멍에서부터 전음(前陰) · 후음(後陰)까지의 부위를 말한다. 상초(上焦) · 중초(中焦) · 하초(下焦)로 나눈다. 상초는 목구멍에서 위(胃)의 분문(噴門)까지, 즉 횡격막 위의 가슴 부위에 해당하는데 여기에는 폐(肺) · 심(心) · 심포락(心包絡) 등 3개의 장기가 속해 있다. 중초는 위의 분문에서 위의 유문(幽門)까지, 즉 횡격막 아래에서 배꼽까지의 부위에 해당하는데 여기에는 비(脾) · 위(胃) 2개의 장기가 속해 있다. 일부 옛 의학서에는 간(肝)을 중초에 소속시켰다. 하초는 위의 유문에서 전음과 후음까지, 즉 배꼽 아래 하복부에 해당하는데 여기에는 간 · 신 · 방광 · 소장 · 대장 등 여러 개의 장기가 속해 있다. 삼초는 몸에서 기와 혈액 순환을 촉진하며 음식물을 소화시켜 영양 물질을 온 몸에 운반하며 수도(水道)가 잘 통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다시 말하여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생명 활동에 필요한 유효성분들인 기 · 혈 · 진액들을 온 몸에 순환시켜서 유기체를 영양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오장 육부를 비롯한 각 장기 계통들은 삼초를 통하여 영양 물질을 받게 된다. 또한 삼초는 수분 대사에도 참가하며 몸에서 생기는 쓸모 없는 물질들과 수분을 소변이나 대변으로 나가게 하는 기능도 한다. 심포락과 표리 관계에 있으며 경락 계통으로는 수궐음심포경(手厥陰心包經)과 연계되어 있다.
상염(上炎) : 인체의 화기(火氣)가 위로 오르는 듯한 증상.
상화(相火) : 간(肝) · 담(膽) · 신(腎) · 삼초(三焦)의 화(火)를 두루 일컬음. 군화[君火 · 심화(心火)]에 상대되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상화라 하면 명문지화(命門之火)를 말한다. 옛 의학서에 상화는 명문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군화와 함께 오장육부를 온양(溫養)하고 그것의 기능 활동을 도와 준다고 했다.
생진윤조(生津潤燥) : 진액(津液)을 생기게 하고 건조한 증상을 윤택(潤澤)하게 하는 효능
선발(宣發) : 기(氣)나 진액을 펴서 잘 보내지도록 함을 일컫는 것.
섭정(攝精) : 정액 배설을 멎게 하는 것. 동설(洞泄)이나 유정(遺精)을 멎게 하는 것을 말한다.
성선(性腺) : 정소 및 난소를 말한다. 정소는 정자를 만드는 이외에 정소 호르몬(testosterone)을 분비하고, 난소는 난자를 만드는 이외에 난포 호르몬(estrogene)과 황체 호르몬(progesterone)을 분비한다.
소간해울(疎肝解鬱) : 간기(肝氣)가 울결된 것을 흩어지게 하는 효능
소식해이(消食解膩) : 사라질 소, 먹을 식, 풀 해, 기름질 이
소종(消腫) : 치료법의 하나. 옹저(癰疽)나 상처가 부은 것을 가라앉히는 방법을 말한다. 약으로는 금은화(金銀花) · 백지(白芷) · 총백(葱白) 등을 쓴다.
소종해독 [消腫解毒] : 종기를 없애고 독성(毒性)을 풀어주는 효능.
수렴(收斂) : 해진 것을 아물게 하고 늘어진 것을 줄어들게 한다.
수장(水臟) : 신(腎)장을 말한다. 신은 오행에서 수(水)에 속하며 몸에서 수분 대사와 소변의 생성과 배설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다.
습비(濕痺) : 습기(濕氣)가 성(盛)하여 형성되는 병증. [금궤요략(金匱要略)] <경습갈병맥증병치(痙濕喝病脈證幷治)>에 나옴. 착비(着痺), 기비(肌痺)라고도 함. [증치준승(證治準繩)] <잡병(雜病)>에는 "습비(濕痺)는 그 비증(痺症)이 한 곳에 머물러 옮겨다니지 않고 땀이 많이 나고 사지가 완약(緩弱)하고 피부가 불인(不仁)하고 정신이 혼미해진다.(濕痺者, 留而不移, 汗多, 四肢緩弱, 皮膚不仁, 精神昏塞)"라고 하였다. [증인맥치(症因脈治)] 제3권에 "습비의 증상은 한 곳이 마비되어 무감각하거나, 팔다리를 들지 못하거나, 몸의 반쪽을 좌우로 틀지 못하거나, 습(濕)이 변하여 열(熱)이 되고 열이 변하여 조(燥)가 되어 당겨 뒤틀리고 아프며 오그라들어 펴기 어려운 것인데 이를 착비(着痺)라 한다. 이것이 습비의 증상이다. 습비의 원인은 낮고 축축한 곳에 거처하여 습기(濕氣)가 침입하였거나 바람을 쐬고 비를 맞아 습(濕)이 기육(肌肉)에 머무르다가 안으로 경맥(經脈)으로 전(傳)해졌거나, 비가 많이 내리고 축축한 해에 기거(起居)를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습비(濕痺)의 치료는 땀이 나면 강활제습탕(羌活除濕湯)을, 가슴이 그득하고 답답하면 복령탕(茯苓湯)을, 풍습(風濕)이 있으면 창방이묘탕(蒼防二妙湯)을, 한습(寒濕)이 있으면 출부탕(朮附湯)을, 습열(濕熱)이 있으면 창백이묘환(蒼柏二妙丸)을 쓴다.(濕痺之症, 或一處麻痺不仁, 或四肢手足不擧, 或半身不能轉側, 或濕變爲熱, 熱變爲燥, 收引拘攣作痛, 蜷縮難伸, 名曰着痺, 此濕痺之症也. 濕痺之因, 或身居卑濕, 濕氣襲人, 或衝風冒雨, 濕留肌肉, 內傳經脈, 或雨濕之年, 起居不愼. ……濕痺之治, 發汗, 羌活除濕湯; 胸滿悶, 茯苓湯; 風濕, 蒼柏二妙湯; 寒濕, 朮附湯; 濕熱, 蒼柏二妙丸.)"고 하였다.
각기병(脚氣病)의 일종. [수세보원(壽世保元)] 제5권에는 "각기(脚氣)는…… 또한 아프면서 무감각한 경우가 있는데 습비라 한다.(脚氣者……亦有疼痛不仁者, 名曰濕痺.)"고 하였다.
신기불고(腎氣不固) : 달리 하원불고(下元不固)라고도 일컬음. 신기(腎氣)가 튼튼하지 못한 것. 신기가 허약해져서 정(精)을 간직하고 소변을 통솔하는 기능이 장애된 것을 말한다. 신기불고되면 유정(遺精), 활정(滑精), 조루, 유뇨증, 야뇨증 등 병증이 생긴다. 신기를 보하고 고삽(固澀)하는 방법으로 치료하는 데 병증상에 따라 금쇄고정환(金鎖固精丸)이나 축천환(縮泉丸) 등을 쓴다.
실면(失眠) : 숙면을 이루지 못하면서 식욕부진, 피로감, 안정(眼睛) 피로, 정충, 경계, 주의력 감퇴, 두통, 설건(舌乾), 변비 등의 증상을 수반하는 수면장애. 불면(不眠)의 다른 이름.
실열(實熱) : 사기(邪氣)가 성할 때 나타나는 열을 말한다. 허열(虛熱)에 상대되는 말이다.
몸에 침범한 외감사기(外感邪氣)가 속으로 들어가면서 열로 변하여 일으키는 병리적 현상을 이르는 말. 열이 몹시 심하고 번갈증(煩渴症)이 나서 찬물을 많이 마시려 하고 변비가 있으며 때로 배가 아파서 배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며 소변은 벌겋거나 누렇고 누런 설태가 껴서 말라 있으며 삭(數)하고 실(實)한 맥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열사(熱邪)를 없애는 방법으로 백호탕(白虎湯)이나 대승기탕(大承氣湯)을 쓴다.
실장(實腸) : 장(腸)의 기능을 증강시키는 효능임
실증(實證) : 팔강변증(八綱辨證)의 하나. 사기(邪氣)가 왕성한 증을 말한다. 몸의 기능 장애로 기혈(氣血)이 울결(鬱結)된 것, 수음(水飮), 담음(痰飮), 식적(食積), 충적(蟲積), 징가(癥瘕), 적취(積聚) 등은 다 실증에 속한다. 주요 증상은 열이 몹시 나고 얼굴이 벌게지며 갈증이 나고 안절부절못하며 심하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헛소리를 하며 배가 그득해지면서 아픈 데 눌러주는 것을 싫어하며 대변이 굳어지고 소변은 벌거며 누런 설태가 두껍게 끼고 맥박 상태가 실(實)하고 힘이 있는 것이다. 부위에 따라 표실증(表實證)과 이실증(裏實證)으로 나눈다.
심계(心悸) :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불안해하는 증. 칠정내상(七情內傷)이나 심혈(心血), 심양(心陽), 심음(心陰)이 부족할 때 혹은 수음(水飮), 어혈, 담화(痰火) 등이 가슴이나 명치 밑에 몰렸을 때 생긴다. 칠정으로 생기면 잘 놀라고 겁이 많으며 잠을 깊이 들지 못하고 꿈이 많으며 식욕이 부진하다. 정신을 안정시키는 것을 위주로 하면서 심혈(心血)을 자양하는 방법으로 정지환(定志丸)이나 주사안신환(朱砂安神丸)에 용골(龍骨)을 더 넣어 쓴다.
심혈부족(心血不足)으로 생기면 얼굴빛이 하야면서 현운(眩暈)이 겸해 나타나는 데 심혈을 보하면서 정신을 안정시키고 비(脾)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으로 귀비탕(歸脾湯) · 자감초탕(炙甘草湯) · 사물안신탕(四物安神湯)을 쓴다. 신음부족(腎陰不足)으로 생기면 가슴이 답답하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하며 어지럽고 이명(耳鳴) 등이 겸해 나타나는 데 신음(腎陰)을 자양하면서 심화(心火)를 없애는 방법으로 육미지황환(六味地黃丸)에 오미자(五味子) · 맥문동(麥門冬) · 백자인(柏子仁)을 더 넣어 쓴다.
심양부족(心陽不足)으로 생기면 어지럽고 가슴과 윗배가 트적지근하면서 몹시 나른하고 손발이 싸늘하며 오싹오싹 추운 증상이 겸해 나타나는 데 심양을 북돋우면서 수음(水飮)을 없애는 방법으로 영계출감탕(苓桂朮甘湯) · 강출탕(薑朮湯)을 쓴다. 정충(怔忡) · 경계(驚悸)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심복냉통(心腹冷痛) : 가슴과 배가 차면서 아픈 증상. 이한(裏寒)의 증후. 흉복부(胸腹部)(胸腹部)가 아프고, 아픈 부위에 냉감이 있음. 비위(脾胃)가 본래 허한 데에 풍한사(風寒邪)가 침습해 정기와 사기가 다투어 상하로 쳐서 일어남.
심포(心包) : 심장의 기능을 대행하고 심장을 보호하는 무형의 장부.
안태(安胎) : 임신부나 태아 자체의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하여 임신이 중절되려는 것을 치료하여 태아가 정상적으로 자라게 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태동불안(胎動不安)이 있을 때 혹은 활태(滑胎 · 습관성 유산)의 경력이 있는 여성들에게서 임신했을 때 안태시키는 치료를 하게 된다. 안태 방법에는 병의 원인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태동불안 · 활태의 항을 참조.
양매창(楊梅瘡) : 달리 매창(霉瘡) · 광창(廣瘡) · 시창(時瘡) · 면화창(棉花瘡)이라고도 부름. 성병의 하나. 매독(梅毒)을 말한다. 창양(瘡瘍)의 겉모양이 양매(楊梅)와 비슷하다고 하여 양매창이라고 하였다. 간접 전염 또는 접촉 전염된다. 처음 외생식기가 헐고 좌우 자개미의 림프절이 종대되며 헌데가 생긴다. 몸에는 열이 있고 머리가 아프며 관절이 저리고 아프다. 목구멍이 아픈 다음 뻘건 반[斑: 양매반(楊梅斑)]과 풍진(風疹) 같은 것[양매진(楊梅疹)]이 생기고 팥알 같은 것이 기육(肌肉) 안에서[양매두(楊梅豆)] 만져진다.
그것이 터지면 살이 밖으로 나온다[번화양매(翻花楊梅)]. 말기에 독이 골수 · 관절이나 장부에까지 침범된 것을 양매결독[楊梅結毒: 매독(梅毒)]이라고 한다. 청열해독(淸熱解毒)하는 방법으로 양매일제산[楊梅一劑散: 마황(麻黃) · 위령선(威靈仙) · 대황(大黃) · 강활(羌活) · 백지(白芷) · 조각자(皁角刺) · 금은화(金銀花) · 천산갑(穿山甲) · 선태(蟬蛻) · 방풍(防風)]을 쓰고 아황산[鵝黃散: 경분(輕粉) · 석고(石膏) · 황백(黃柏)]을 바른다.
양성음허(陽盛陰虛) : 몸 안에 양(陽)이 성하고 음(陰)이 허한 것. 양성음허하면 얼굴이 벌겋고 더운 것을 싫어한다. 맥상(脈象)에서 세게 누르면 맥이 허(虛)하고 소(小)하며 가볍게 누르면 대(大)하고 실(實)하다.
맥상에서 표실이허맥(表實裏虛脈).
양위(兩衛) : 두 가지 위(衛)를 통틀어서 일컬음. 옛 의학서에 피부에 퍼져 있는 위기(衛氣)를 체표의 위(衛)라 하고 비(脾)가 주관하는 기육(肌肉)을 장부의 위(衛)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위(衛)를 합해서 양위라 한다고 하였다. 일부 옛 의학서에는 양(陽)과 음(陰)을 순행시키는 위기를 양위라 하였다.
양위(陽痿) : 신(腎)이 쇠약하여질 나이가 되지 않았는데도 음경(陰莖)이 발기되지 않거나 발기되더라도 단단하지 않은 것. 대부분 방사(房事)가 과도하여 명문(命門)의 화(火)가 쇠약하여짐으로써 발생한다. 또는 억울(抑鬱)로 인하여 간(肝)이 손상되거나, 노심초사, 놀라움, 두려움으로 인하여 심비(心脾)가 손상되거나, 간경(肝經)에 습열(濕熱)이 생기거나 음습(陰濕)이 양을 손상시키는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기도 한다. 명문의 화(火)가 쇠약한 경우는 활정(滑精), 요산(腰痠)하며 한기(寒氣)를 싫어하고 사지가 냉하며 맥은 침세(沈細)하다.
양증(陽證) : 팔강변증(八綱辨證)의 하나. 병을 음양(陰陽)의 속성으로 갈라 볼 때 양에 속한 병증인 표증(表證) · 열증(熱證) · 실증(實證)을 말한다. 음증(陰證)에 상대되는 말이다. 일반 증상은 열과 오한이 나고 얼굴이 벌게지며 머리가 아프고 서늘한 것을 좋아하며 안절부절못하며 입술이 말라서 터지고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며 말소리와 숨결이 거칠어지고 변비가 오며 배가 아파서 만지지 못하게 하며 소변은 벌거면서 양이 적고 누런 설태가 껴서 말라 있으며 맥박 상태는 부(浮) · 홍(洪)하고 삭(數)하면서 힘있게 뛰는 것이다.
양 자체에 생긴 병증. 예를 들면 양허증(陽虛證) · 망양증(亡陽證) 등이다.
양혈(涼血) : 청법(淸法)의 하나. 혈분(血分)에 사열(邪熱)이 성한 병증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양혈산혈법(涼血散血法)과 양혈해독법(涼血解毒法)이 있다.
연년익수(延年益壽) : 오래 살게 한다는 말.
열사(熱邪) : 달리 사열(邪熱)이라고도 일컬음. 병인(病因)의 하나. 열의 속성을 가진 사기를 말한다. 몸에 열사가 침입하면 열이 나고 숨이 차며 얼굴과 눈이 벌겋게 되고 갈증이 나며 안절부절못하며 소변이 벌겋고 변비가 생기며 심하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경련이 일어나는 등 실열증(實熱證) 증상이 나타난다.
영류(癭瘤) : 갑상선종에 속하며 간기가 울결되어 나타난다.
영심(寧心) : 마음의 불안 등을 가라앉히고 편안하게 하는 치료방법
오로칠상(五勞七傷) : 오로는 오장이 허약해서 생기는 허로(虛勞)를 5가지로 나눈 것으로, 심로(心勞), 폐로(肺勞), 간로(肝勞), 비로(脾勞), 신로(腎勞) 등이고, 칠상은 남자의 신기(腎氣)가 허약하여 생기는 음한(陰寒), 음위(陰痿), 이급(裏急), 정루(精漏), 정소(精少), 정청(精淸), 소변삭(小便數) 등 7가지 증상을 일컫는다.
오심(惡心) : 가슴이 불쾌하고 울렁거리며 구역질이 나면서도 토하지 못하고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
온역(溫疫) : 역려의 기(돌림병을 일으키는 독한 기운)를 감수함으로써 발생한 급성열성(急性熱性) 전염병.
온중익기(溫中益氣) : 중초(中焦)를 따뜻하게 하고 기(氣)를 증강시키는 효능.
옹종(擁腫) : 몸에 난 작은 종기가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증세로 가려움증이나 따가운 증세.
우피선(牛皮癬) : 만성적인 소양성피부병(瘙痒性皮膚病)의 하나. 앓는 곳의 살갗이 두툼해지면서 굳어진 것이 마치 소 목덜미의 가죽처럼 생겨서 우피선이라고 함. 풍습열독(風濕熱毒)이 살갗에 뭉쳐 일어나거나 영혈(營血)이 부족하거나 혈(血)이 허하여 풍조(風燥)가 생겨 기부(肌膚)를 영양하지 못하여 일어나는데, 정지부조(情志不調)와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 목의 앞뒤에 생기는데 주와(肘窩)나 괵와(膕窩), 상안검(上眼瞼), 회음(會陰)부위, 대퇴(大腿)내측 등에도 생길 수 있다. 초기에는 살갗이 가렵다가 계속하여 좁쌀알만한 불규칙적인 납작하고 꽉차 있는 구진(丘疹)이 나타난다. 빛깔은 정상적인 살색과 같거나 연한 갈색을 띠고, 합쳐져 조각을 이루면 살갗이 바짝 마르고 두툼해지며 점점 퍼져 간간이 참기 어려운 가려움이 일어나면서 밤이 되면 더 심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신경성 피부염, 일부 만성 습진이 포함된다.
위완한통(胃脘寒痛) : 위가 차서 생기는 통증
유뇨증(遺尿症) : 5세가 지난 아이가 적어도 3개월 동안 최소한 주당 2회 밤이나 낮에 침구나 옷에 반복적으로 소변을 보는 증상.
유방결괴(乳房結塊) : 유방에 맺힌 덩어리
유방창통(乳房脹痛) : 월경 전 혹은 월경이 막 이르렀을 때 유방이 팽창하면서 흉협 혹은 유두가 딴딴하고 가려우며 아픈 증상. 심한 경우 손을 대지 못할 정도이고 옷만 스쳐도 아프다. 대부분 간기울결(肝氣鬱結)로 인해 유발됨.
유옹(乳癰) : 또 투유(妒乳) · 취내(吹嬭)라고도 일컬음. 유방에 생긴 옹(癰). 흔히 해산한 뒤에 생기는 데 간기울결(肝氣鬱結)과 위열(胃熱)이 옹체되어 생긴다. 처음에는 유방이 단단하면서 멍울이 지고 부어오르면서 아프며 젖이 잘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오한이 나면서 열이 난다. 병이 더 진행되면 단단한 것이 더 크게 부어오르고 화끈화끈 달아오르며 심한 통증이 나타난다. 곪으면 피부는 붉은빛을 띠고 단단한 멍울의 한 부분이 말랑말랑해지며 파동이 있다.
곪기 전에는 청열소간해울(淸熱疏肝解鬱)하는 방법으로 금은화탕(金銀花湯)과 사역탕(四逆湯), 곪는 시기에는 과루우방탕(瓜蔞牛蒡湯), 완전히 곪았을 때는 탁리법(托裏法)으로 탁리소독음(托裏消毒飮)을 가감하여 쓴다. 외치법으로 곪기 전에는 한약 찜질과 젖꼭지 방향으로 문질러 주는 등 안마 요법을 하고 금황산(金黃散) · 황단고(黃丹膏)를 붙인다. 양구(梁丘) · 견정(肩井) · 유근(乳根) · 격수혈(膈兪穴) 등에 침을 놓거나 기죽마혈(騎竹馬穴)에 뜸을 뜬다. 이미 곪았으면 화침(火鍼)으로 고름을 빼고 구담(狗膽) 심지를 넣거나 수술을 한다. 민간 요법으로 선인장 · 산약(山藥) · 토삼칠(土三七) 등을 짓찧어 하루에 여러 번 붙이거나 포공영(蒲公英) 15~20g을 물에 달여 하루 2번 먹는다.
유정(遺精) : 정액이 저절로 나오는 병증. 칠정내상(七情內傷)으로 심화(心火)가 성하거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기혈이 허하거나 신음(腎陰) · 신양(腎陽)이 부족했을 때, 하초(下焦)에 습열사(濕熱邪) 등이 몰려서 생긴다. 유설(遺泄)이라고도 한다. 심화가 성할 때는 몽설(夢泄)이 있으며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온 몸이 노곤하고 정신이 흐리멍덩하며 소변이 적고 누르며 설질(舌質)은 붉다.
심화를 제거하면서 정신을 진정시키는 방법으로 삼재봉수단(三才封髓丹)을 쓴다. 신음이 부족할 때는 유정과 함께 어지럽고 이명(耳鳴)이 있으며 허리에 힘이 없거나 아프며 때로 오싹오싹 추우면서 뼛속이 달아오르는 감과 미열이 있다. 신음을 강화하고 자양하여 허화(虛火)를 제거하고 삽정(澀精)하는 방법으로 육미지황환(六味地黃丸)에 검실(芡實) · 오미자(五味子) · 금앵자(金櫻子) · 진피(陳皮) 등을 더 넣어 쓴다. 신양(腎陽)이 부족할 때는 유정과 함께 얼굴에 핏기가 없고 우울하며 허리와 손발이 싸늘하고 저절로 땀이 난다. 신양을 북돋우면서 삽정하는 방법으로 녹용대보탕(鹿茸大補湯) · 녹각산(鹿角散)을 쓴다. 습열사가 성할 때는 유정과 함께 몸이 무거우며 입이 쓰고 목이 마르며 소변이 붉다.
습열사를 없애는 방법으로 가미이진탕[加味二陳湯: 치자(梔子) · 황백(黃柏) · 지모(知母) · 반하(半夏) · 적복령(赤茯苓) · 진피(陳皮) · 백출(白朮) · 생강(生薑) · 길경(桔梗) · 승마(升麻) · 시호(柴胡) · 석창포(石菖蒲)] · 저두환 (豬肚丸)에 차전자(車前子) · 택사(澤瀉) 등을 더 넣어 쓴다. 유정은 크게 몽설(夢泄) · 누정(漏精 · 滑精)으로 나누거나 원인에 따라 습열유정(濕熱遺精) · 울열유정(鬱熱遺精) · 양허유정(陽虛遺精) · 담옹유정(痰壅遺精) · 간열유정(肝熱遺精) 등으로 나눈다.
경외기혈(經外奇穴). 배꼽 중심에서 아래로 3치 내려가 다시 양 옆으로 각각 1치 나가 있다. 유정(遺精), 조루(早漏), 음위(陰痿), 음낭 습진에 쓰는데 침은 8푼~1치 깊이로 놓는다.
유합(癒合) : 생물의 세포, 조직, 기관 등이 합쳐지는 것.
윤장통변(潤腸通便) : 장(腸)을 적셔주고 대변(大便)을 통하게 하는 효능.
윤조(潤燥) : 치료법의 하나. 음정(陰精)을 강화하고 자양 하며 진액을 생겨나게 하는 약으로 음허(陰虛)나 진액이 부족한 것을 치료하는 방법을 말한다. 윤조에는 경선윤조(輕宣潤燥) · 감한자윤(甘寒滋潤) · 감한생진(甘寒生津) · 청장윤조(淸腸潤燥) · 양음윤조(養陰潤燥) · 양혈윤조(養血潤燥) 등이 있다. 마른 것을 촉촉하게 한다는 뜻으로도 쓰인다.
음액(陰液) : 정(精) · 혈 · 진액 등 체액을 두루 일컬음. 체액은 음(陰)에 속한다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다.
음위절상(陰痿絶傷) : 그늘 [음], 저리다, 마비되다 [위], 끊다, 죽다, 다하다, 끝나다 [절] , 다치다, 해치다 [상]
음중통(陰中痛) : 음부 또는 요도가 아픈 것. 임증(淋證) 때 볼 수 있다.
음허내열(陰虛內熱) : 음액(陰液)이 손상되어 수(水)가 화(火)를 제압하지 못하는 데에서 생기는 발열 병증. 음허발열(陰虛發熱)이라고도 함. [소문(素問)] <조경론(調經論)>에 "음허(陰虛)하면 내열(內熱)이 된다.(陰虛則內熱.)"라고 하였다.
음허도한(陰虛盜汗) : 도한(盜汗)의 하나. 음정(陰精)이 소모되고 허열(虛熱)이 생겨서 나는 땀을 말한다. 잠이 들면 땀이 나고 미열이 나며 양볼이 불그스름하고 손발바닥 중심에 열이 남과 동시에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해 하며 유정(遺精)이나 월경 장애가 온다. 음정(陰精)을 자양하며 열을 내리는 방법으로 당귀육황탕(當歸六黃湯)이나 자음강화탕(滋陰降火湯)을 쓴다.
음허화왕(陰虛火旺) : 음정(陰精)이 부족해져서 허화(虛火)가 왕성해진 것. 증상은 번조증(煩躁症)이 나고 화를 잘 내며 볼이 붉어지고 입이 마르며 목이 아프고 성욕이 더욱 강해진다.
음황(陰黃) : 황달을 크게 둘로 나눈 것의 하나. 양황(陽黃)이 오래도록 낫지 않거나 기혈 부족, 비양부족(脾陽不足)으로 비위(脾胃)에 한습사(寒濕邪)가 몰려서 생긴다. 대체로 만성적으로 경과하는 데 황달색이 선명하지 못하고 검으며 식욕이 부진하고 배가 불러오르며 몹시 피곤해 하고 옆구리가 은은히 아프며 몸과 손발이 차고 몸이 여위며 대변은 굳지 않고 소변은 누르면서 잘 나오지 않는다. 설질(舌質)은 희읍스름하고 설태는 기름때 같다.
비양(脾陽)을 도와 주면서 한습사(寒濕邪)를 없애는 방법으로 인진부자탕(茵陳附子湯)이나 인진강부탕(茵陳薑附湯)에 각각 백출(白朮) · 복령(茯苓) · 택사(澤瀉) 등을 더 넣어 쓴다. 만일 명치 밑과 옆구리가 트적지근하면서 불러오르는 등 간기(肝氣)가 정체된 증상이 심하면
이기관중(理氣寬中) : 기(氣)를 통하게 하고 속을 편안하게 하는 효능
이기산결(利氣散結) : 기(氣)가 울체된 것을 풀어 맺힌 것을 흩어지게 하는 효능
이급후중(裏急後重) : 아랫배가 끌어당기는 것 같이 아프면서 금시 대변이 나올 것 같아 자주 변소에 가나 대변이 시원히 나오지 않고 뒤가 무직한 것. 주로 습열사(濕熱邪)로 기가 몰려 생기는 이질의 주되는 증상의 하나이다.
이수/리수(利水) : 이소변(利小便)의 다른 이름. 소변이 잘 나오게 한다는 말.
임맥(任脈) : 기경팔맥(奇經八脈)의 하나. 몸의 앞정중선에 분포된 경맥이다. 회음(會陰)에서 시작하여 음부와 뱃속을 지나 관원혈(關元穴) 부위를 거쳐 몸의 앞정중선을 따라 곧바로 목구멍에까지 가서 입술을 돈 다음 뺨을 지나 눈 속으로 들어간다. 눈 아래의 승읍혈(承泣穴)에서 위경(胃經)과 연계된다. 순행 과정에 배와 가슴 부위의 장부들과 연계를 가지며 또 족삼음경(足三陰經)과 음유맥(陰維脈) · 충맥(衝脈) 등과 교회(交會)하며 온 몸의 음경(陰經)을 조절한다. 임맥에 병이 들면 남자는 산증(疝症); 여자는 월경 불순, 자궁 출혈, 대하증, 불임증, 유산 등의 병증이 나타난다.
임증(淋證) : 달리 림(淋) · 임질(淋疾)이라고도 함. 소변을 자주 누려고 하나 잘 나오지 않으면서 방울방울 떨어지며 요도와 아랫배가 켕기면서 아픈 병증. 하초(下焦)의 습열사(濕熱邪)가 방광에 몰리거나 신기(腎氣)가 허하여 방광의 기화(氣化) 작용이 장애되어 생긴다. 《동의보감(東醫寶鑑)》에 임증은 모두 열증(熱證)에 속하는데 간혹 냉증(冷證)에 속하는 것도 있다고 하였다.
증에 따라 열을 내리고 몰린 것을 풀어 주며 기와 혈액 순환을 촉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자음법(滋陰法)을 배합한다. 원인과 증상에 따라 기림(氣淋) · 혈림(血淋) · 석림(石淋) · 노림(勞淋) · 열림(熱淋) 등 오림(五淋)으로 나눈다. 열림 대신 고림(膏淋)을 넣은 데도 있고 오림에 고림(膏淋) · 사림(砂淋) · 냉림(冷淋)을 합해서 팔림(八淋)으로 나눈 것도 있다.
자보강장(滋補强壯) : 정기를 기르고 기(氣)와 양(陽)을 보하며 튼튼히 하는 효능.
자음(滋陰) / 보음(補陰) : 달리 익음(益陰) · 양음(養陰) · 육음(育陰)이라고도 부름. 보법(補法)의 하나를 말한다. 음정(陰精)이 부족한 것을 강화하고 자양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심음(心陰)이 부족하여 가슴이 두근거리고 건망증이 있으며 잠을 잘 이루지 못하면서 꿈이 많은 등 증상이 나타날 때는 심음을 강화하고 자양하는 보심단(補心丹)을 쓰고, 간음(肝陰)이 부족하여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피부의 감각이 둔하며 손발이 떨리고 야맹증이 있을 때에는 간음을 강화하고 자양하는 기국지황환(杞菊地黃丸)을 쓰며, 폐음(肺陰)이 부족하여 기침하다가 사레가 들리고 걸쭉하면서 피가 섞인 가래가 나오고 오후에 미열이 나며 식은땀이 나고 불안해 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목이 마르며 목이 쉬는 등 증상이 나타날 때는 폐음을 자양하는 백합고금탕(百合固金湯)을 쓰고, 신음(腎陰)이 부족하여 허리와 다리가 저리고 아프면서 힘이 없고 유정(遺精), 현기증, 이명(tinnitus), 건망증, 불면증 등 증상이 나타날 때는 신음을 강화하고 자양하는 좌귀음(左歸飮)이나 육미지황탕(六味地黃湯)을 쓰는 것 등이다.
자음윤조(滋陰潤燥) : 달리 양음윤조(養陰潤燥)라고도 부름.
윤조법(潤燥法)의 하나. 조열사(燥熱邪)로 폐(肺)와 신(腎)의 음(陰)이 허해져서 생긴 조증(燥證)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오후에 열이 나면서 입술이 마르며 때로 마른기침이 나고 숨이 차며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고 손발바닥이 달아오르며 혀가 붉어지고 맥박 상태가 세삭(細數)한 등 폐와 신의 음이 부족하여 허화(虛火)가 떠오른 증상이 나타날 때에 자음윤조법으로 백합고금탕(百合固金湯)을 쓰는 것 등이다.
음을 자양하여 마른 것을 촉촉하게 한다는 뜻으로도 쓰인다.
자한(自汗) : 한증(汗證)의 하나. 깨어 있을 때 몸에 부담을 줌이 없이 저절로 나는 땀을 말한다. 주로 폐기(肺氣)가 허약하고 위양(衛陽)이 튼튼하지 못하여 생긴다. 그 밖에 혈허(血虛), 담(痰)이 몰리거나 습사(濕邪)에 상하여서도 생긴다. 땀내는 약을 먹지 않았는데 늘 축축하게 땀이 나며 조금만 움직여도 심해진다. 일반 치료 원칙은 원인에 따라 기허(氣虛)이면 익기고표(益氣固表)하고 양허(陽虛)이면 온양고표(溫陽固表)하는 것을 위주로 하면서 땀을 멎게 하는 방법을 배합하여 쓰는 것이다. 원인에 따라 기허자한(氣虛自汗) · 양허자한(陽虛自汗) · 혈허자한(血虛自汗) · 상습자한(傷濕自汗)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장조증(臟躁證) : 정신 신경 장애 증상의 하나를 말한다. 《동의보감(東醫寶鑑)》에서는 장조증은 정신 이상 때와 같이 슬퍼하며 울기를 잘하고 하품과 기지개를 자주 하는 데 이때는 감맥대조탕(甘麥大棗湯)을 쓰거나 대추를 약성이 남게 태워서 가루를 낸 다음 미음에 타서 복용한다고 하였다. 주로 여성 환자들에게서 볼 수 있다.
장풍(腸風) : 결핵성 치질에 의해 대변을 볼 때 피가 나오는 병증.
장화익토(壯火益土) : 화기(火氣)를 보충하여 상생(上生)작용으로 토기(土氣)의 영양을 유도하는 효능임.
적취(積聚) : 체증(滯症)이 오래되어 뱃속에 덩어리가 생겨나는 경우.
정수(精髓) : 뼈 안의 골수
정창(疔瘡) : 또 정창(丁瘡) · 정종(疔腫) · 자창(疵瘡)이라고도 함. 헌데의 하나. 작고 단단하고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것이 쇠못과 비슷하다고 하여 정창이라고 하였다. 생긴 부위와 증상에 따라 면정(面疔) · 지정(指疔) · 족정(足疔) · 난정(爛疔) · 홍사정(紅絲疔) · 역정(疫疔) 등 여러 가지로 불린다. 흔히 열독(熱毒)이 몰려서 생긴다. 초기에 좁쌀알 같은 것이 나서 단단하고 뿌리가 깊이 박힌다.
이어 벌겋게 부으며 화끈 달아오르고 심한 통증이 생긴다. 곪아터지고 근(根)이 빠진 다음에야 부기가 가라앉고 통증이 멎는다. 청열해독법(淸熱解毒法)으로 오미소독음(五味消毒飮)이나 황련해독탕(黃連解毒湯)을 가감하여 쓴다. 외치법으로 초기에는 천추고(千捶膏)나 옥로산(玉露散)을 바셀린에 개어 바른다. 손으로 짜거나 너무 일찍 째지 말아야 한다. 완전히 곪았을 때에는 째서 고름을 뽑고 새살이 돋도록 생기산(生肌散)을 뿌린다.
제심익사(提心益思) : 끌 제, 마음 심, 더할 익, 생각 사
조설(早泄) : 성생활 시에 정액(精液)이 지나치게 빨리 나오는 증상임
조열(潮熱) : 발열의 하나. 밀물처럼 일정한 시간에 나는 열을 말한다. 크게 실증조열(實證潮熱)과 허증조열(虛證潮熱)로 나눈다. 실증 때는 매일 오후(3~5시)에 높은 열이 났다가 완전히 내리지 않고 늘 안절부절못하며 대변은 굳고 배가 그득하며 단단한 증상이 나타난다. 실열(實熱)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백호탕(白虎湯)이나 승기탕(承氣湯)을 가감해서 쓴다. 실증은 양명부실증(陽明腑實證)이나 습온병(濕溫病) 때 볼 수 있다. 허증 때는 오후나 밤에 미열이 났다가 새벽에는 완전히 내리는데 늘 손발바닥이 달아오르며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난다.
음혈(陰血)을 보하고 비위(脾胃)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으로 청골산(淸骨散)이나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을 가감하여 쓴다. 또한 기가 허하면서 땀이 나고 조열이 있는데는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을, 기가 허하면서 땀이 없이 조열이 나는 데는 인삼청기산(人參淸肌散)을, 혈이 허하면서 땀이 나며 조열이 나는 데는 인삼양영탕(人參養榮湯)을, 혈이 허하면서 땀이 없이 조열이 나는 데는 복령보심탕(茯苓補心湯)을, 기혈이 다 허하고 땀이 나면서 조열이 나는 데는 가감소요산(加減逍遙散)을 각각 쓴다. 허증조열은 병을 오래 앓거나 각종 만성 질병으로 몸이 허약할 때 나타난다.
조중이기(調中理氣) : 허리(虛痢)로 기운이 약하고 노곤한 것을 치료하는 처방
종독(腫毒) : 몸에 헌데 또는 헌데에 독이 생긴 증상임
좌창(痤瘡) : 여드름 같은 작은 뾰루지
주리(腠理) : 피부 · 근육 · 장부의 무늬와 피부나 근육 조직 간극(間隙)의 결합 조직을 말한다. 옛 의학서에는 주리를 피주(皮腠) · 기주(肌腠) · 조리(粗理) · 세리(細理) · 소리(小理) · 초리(膲理) 등으로 나누어 보았다. 주리는 몸 안의 수분을 배설하고 기혈을 통하게 하며 외사(外邪)의 침범을 방어하는 기능을 한다고 했다.
땀구멍과 피부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중기하함(中氣下陷) : 달리 비기하함(脾氣下陷) · 기허하함(氣虛下陷)이라고도 부름. 비기(脾氣)가 허해서 장부들이 아래로 처지는 병증. 음식 조절을 잘못했거나 육체적 과로, 그 밖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 비(脾)를 상하면 비기가 허해져서 끌어올리는 기능이 장애되어 생긴다. 얼굴에 핏기가 없고 권태감이 심하여 어지럽고 땀이 잘 나며 숨결이 밭고 음식을 적게 먹으며 설사를 자주 한다. 배는 아래로 처져 내려가는 감이 있고 때로는 탈항이 되거나 소변이 방울방울 떨어지며 설질(舌質)은 희읍스름하고 설태(舌苔)는 얇으며 희다. 비를 튼튼하게 하면서 비기를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을 가감하여 쓴다. 또는 침뜸치료를 배합할 수 있다.
중초(中焦) : 삼초(三焦)의 하나. 삼초의 중부를 말한다. 횡격막[또는 위(胃)의 분문(噴門)]에서 배꼽 부위[또는 위(胃)의 유문(幽門)]까지의 윗배에 해당한다. 중초에는 비위(脾胃)가 속해 있기 때문에 중초의 주요 기능은 비(脾) · 위(胃)의 기능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즉 비위(脾胃)가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정미로운 물질을 흡수하여 온 몸을 영양하는 기능을 도와 준다. 그러므로 중초의 기능이 장애되면 소화 장애와 영양 장애 등 비위의 기능이 장애된 증상들이 나타난다.
지해평천(止咳平喘) : 기침을 멈추고 천식(喘息)을 안정되게 하는 효능
지해화담(止咳化痰) : 기침을 멈추고 담(痰)을 없애는 효능
창양(瘡瘍) : 몸 겉에 생기는 여러 가지 외과적 질병과 피부 질병을 통틀어 말한다. 창양에는 종양과 궤양 · 옹(癰) · 저(疽) · 정창(疔瘡) · 절종(癤腫) · 유주(流注) · 유담(流痰) · 나력(瘰癧) 등이 포함되며 임상에서 자주 본다. 창양은 흔히 사독(邪毒)이 침입하고 사열(邪熱)이 혈을 상하여 기혈이 몰려서 생긴다.
청맹(靑盲) : 달리 흑맹(黑盲)이라고도 부름. 점차 눈이 잘 보이지 않아 나중에는 밝고 어두운 것도 가려 볼 수 없게 되는 병증. 간신(肝腎)의 부족으로 정혈(精血)이 눈에 올라가지 못할 때, 심음(心陰)의 소모로 신기(神氣)가 작용하지 못할 때, 비위(脾胃)의 기능 장애로 정미로운 물질이 눈에 올라가지 못할 때, 칠정울결(七情鬱結)로 기혈이 막힐 때, 눈외상으로 목계(目系)가 손상될 때 생긴다. 보통 시첨혼묘(視瞻昏眇), 고풍작목(高風雀目), 청풍내장(靑風內障), 폭맹(暴盲)과 같은 눈병 때 온다. 처음에 물체가 뿌옇게 보이며[시첨혼묘(視瞻昏眇)] 때로 눈앞에 색이 있는 암점이 나타난다[시첨유색(視瞻有色)]. 시력은 점차 더 나빠져 나중에는 밝고 어두운 것도 가릴 수 없게 된다. 또 점차 보는 범위가 좁아지면서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게 된다.
시신경유두는 하얗고 경계는 뚜렷하다. 망막 중심동맥과 정맥은 가늘어진다. 때로는 황반부에 변성 변화가 있다. 간신(肝腎)의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것은 간신을 자양하는 방법으로 좌귀환(左歸丸) · 명목지황환(明目地黃丸)을; 심음(心陰)의 소모로 인한 것은 심신(心神)을 보하고 안정시키는 방법으로 인삼양영탕(人參養榮湯)을; 비위(脾胃)의 장애로 인해 생기는 것은 비를 튼튼하게 하고 기를 보하는 방법으로 삼령백출산(參苓白朮散)을; 간기울결(肝氣鬱結)로 인해 생기는 것은 뭉친 간기(肝氣)를 푸는 방법으로 소요산(逍遙散)을; 외상으로 인한 것은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어혈을 없애는 방법으로 도홍사물탕(桃紅四物湯)을 쓴다. 구후(球後) · 정명(睛明) · 계백 · 건명(健明) · 신수(腎兪) · 합곡(合谷) · 예명(翳明) · 양백(陽白) · 비노(臂臑) · 풍지혈(風池穴)에 침을 놓는다.
청보(淸補) : 치료법의 하나. 성질이 서늘한 약으로 보하는 방법이다. 열병을 앓은 뒤 미열이 나면서 음액(陰液)이 줄어든 증상이 나타나는 병증에 쓴다. 예를 들면 열병을 오래 앓아서 폐음(肺陰)이 부족해진 증상이 나타날 때 사삼맥문동탕(沙參麥門冬湯)을 쓰는 것, 위음(胃陰)이 부족한 증상이 나타날 때 옥녀전(玉女煎)을 쓰는 것, 대장의 진액이 부족한 증상이 나타날 때 증액탕(增液湯)을 쓰는 것 등이다.
청심명목(淸心明目) : 맑을 청, 마음 심, 밝을 명, 눈 목
청열이뇨(淸熱利尿) : 소변을 잘 나가게 하여 열기를 빼내는 효능
청열지갈(淸熱止渴) : 열기를 식히고 진액이 손상되어 생긴 갈증을 멎게 하는 효능
청열해독(淸熱解毒) : 열독(熱毒) 병증을 열을 내리고 독을 없애는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
청폐(淸肺) : 열기에 의해 손상된 폐기를 맑게 식히는 효능
충맥(衝脈) : 기경팔맥(奇經八脈)의 하나. 포궁(胞宮 · 자궁)에서 시작하여 척추를 따라 올라간다. 체표면을 지나가는 가지는 포궁에서부터 아랫배로 나와 족소음신경(足少陰腎經)과 함께 배꼽 옆을 지나 올라가 가슴에 가서 흩어진 다음 다시 올라가 목구멍을 지나 입술에 퍼진다. 충맥은 오장 육부의 해(海)이며 온 몸의 기혈을 조절한다.
충맥에는 횡골(橫骨) · 대혁(大赫) · 기혈(氣血) · 사만(四滿) · 중주(中注) · 황수(肓兪) · 상곡(商曲) · 석관(石關) · 음도(陰都) · 통곡(通谷) · 유문(幽門) 등 족소음신경의 혈 및 임맥(任脈)의 회음(會陰), 위경(胃經)의 기충혈(氣衝穴) 등 교회혈(交會穴)이 있다. 충맥에 병이 생기면 산증(疝症), 하복통, 기가 상역(上逆)하는 증상, 심통(心痛) 등이 나타난다. 충맥은 월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임신과 관계된다. 태충맥(太衝脈) · 경맥지해(經脈之海)라고도 한다.
탈항(脫肛) : 달리 절장(截腸)이라고도 부름. 항문 및 직장 점막 또는 전층이 항문 밖으로 빠져 나오는 병증. 중기(中氣)가 허하거나 습열사(濕熱邪)가 직장에 몰려서 생기는 데 어린아이와 노인에게서 자주 보며 설사와 이질을 오래 앓았을 때, 해산한 뒤에 자주 본다. 탈항 초기에는 뒤를 볼 때 나왔다가 저절로 들어가지만 오래 되면 오랫동안 서 있거나 걸을 때, 무거운 것을 들 때, 또는 기침을 할 때에도 나오고 손으로 밀어 넣어야 들어간다. 탈항이 되어서 오래 있으면 나온 부위가 부으면서 아프고 점차 거무스레한 자줏빛을 띠며 점액이나 피가 나오고 심하면 썩어 떨어진다.
탈항 정도에 따라 항문만 빠져 나온 것을 항문탈 · 불완전 탈항이라고 하고, 직장이 빠져 나온 것을 직장탈 · 완전 탈항이라고 하며, 이 두 가지가 겸한 것을 항문직장탈이라고 한다. 탈항 때는 중초(中焦)의 기를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삼기탕(參耆湯) ·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을 쓰거나 습열사(濕熱邪)를 없애는 방법으로 사물탕(四物湯)에 황금(黃芩) · 황련(黃連) · 괴각(槐角) · 승마(升麻) · 시호(柴胡) 등을 더 넣어 쓴다. 외치법으로 항문이 밖으로 빠져 나왔을 때는 약천에 연고를 발라서 국소에 대고 손으로 밀어 넣는다. 자주 나오면 주사 요법, 결찰(結紮) 요법, 부식 요법, 훈세(熏洗) 요법, 수술 요법 등을 적용한다.
탕상(燙傷) : 끓는 물이나 뜨거운 기름에 팔다리를 데인 병증
토사곽란(吐瀉癨亂) : 토하고 설사하여 배가 심하게 아픈 증상.
통림(通淋) : 소변을 누려고 하나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방울방울 떨어지면서 요도와 아랫배가 아픈 병을 치료
폐옹(肺癰) : 옹(癰)의 하나. 폐에 농양이 생긴 병증을 말한다. 외감사(外感邪)나 내상(內傷)으로 폐의 기와 혈액 순환을 장애하여 생긴 열이 폐음(肺陰)이나 혈을 상하여 생긴다. 초기에는 오슬오슬 춥고 열이 나며 기침이 나고 가슴이 아프며 걸쭉한 가래가 나오고 숨이 차다. 입이 마르고 혀는 누르며 맥박 상태는 부활삭(浮滑數)하다. 고름이 생기는 때는 입과 목구멍이 마르고 은근한 흉통(胸痛)이 있으며 기침과 함께 냄새가 나는 피고름이 섞인 가래가 나온다. 소변은 붉고 변이 굳으며 맥박 상태는 부활삭하면서 힘이 없고 때로 홍대(洪大)하기도 하다.
말기에 고름주머니가 생기고 정기가 몹시 쇠약해지면서 기침과 함께 피고름이 섞인 가래가 많이 나오고 심하면 가래가 묽은 죽처럼 된다. 피부는 마르고 거칠어지며 윤기가 없어진다. 초기에 표증을 풀고 열을 내리는 방법으로 삼소음(參蘇飮)이나 은교산(銀翹散)을 쓰고 고름이 생기는 때는 고름을 제거하고 열독(熱毒)을 없애는 방법으로 길경탕(桔梗湯) · 소농음(消膿飮)을 쓰거나 길경탕에 천금위경탕(千金韋莖湯)을 같이 쓰며 고름이 생긴 때는 고름을 빼면서 정기를 보하는 방법으로 삼기보폐탕(參耆補肺湯)이나 삼출보비탕(參朮補脾湯) 등을 가감하여 쓴다. 이 밖에 민간요법으로 의이인(薏苡仁) · 패장근(敗醬根) · 금은화(金銀花) · 황기(黃耆) 등을 쓴다. 고식적 치료로 낫지 않으면 수술적 방법으로 치료한다.
포제(炮製) : 한방에서, 자연에서 채취한 원생약을 약으로 처리하는 과정.
한방에서 자연 상태의 식물이나 동물, 광물 등을 약으로 사용하기 위해 처리하는 과정이다. 부피가 큰 것은 나누고 단단한 것은 무르게 하며 독성이 있으면 제거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된다. 치료효과를 높이거나 새로운 효능을 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대개 물이나 불을 사용한다.
물은 기본적으로 흙이나 이물질을 씻어낸다. 재료에 뿌려서 자르기 쉽게 하며, 잘게 부순 재료를 가라앉혀 분리하기도 한다. 또한 독성을 줄이기도 하고 성질을 완화시키기도 한다. 한편 불은 재료를 건조시키며 가루로 만들기 쉽게 하고 변형시키기도 한다. 또한 재료에 다른 물질이 섞이게도 할 수 있다. 물과 불을 한꺼번에 사용하는 경우도 흔하다. 재료를 물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삶거나 수증기로 찔 수 있다. 법제(法製)의 다른 이름.
표증(表證) : 육음(六淫)이나 역려(疫癘) 등 표에 외사(外邪)가 침입하여 생긴 병증을 통틀어서 일컬음. 일반적으로 몸의 정기(正氣)가 허약해졌을 때 외사가 표를 침입해서 생긴다. 표가 튼튼하고 정기가 왕성할 때는 표에 외사가 쉽게 침입할 수 없으며 만약 침입하여 병을 일으켜도 경하게 경과한다. 체질이 튼튼한가 약한가에 따라 그리고 사기의 성질에 따라 표증 증상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데 가장 일반적인 증상은 오싹오싹 춥고 바람을 싫어하며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며 맥박 상태가 부(浮)한 것이다. 특히 오싹오싹 추우면서 열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해표법(解表法)으로 치료한다. 침입한 사기의 성질과 정기의 허실에 따라 표한증(表寒證) · 표열증(表熱證) · 표허증(表虛證) · 표실증(表實證) 등으로 나눈다.
풍열(風熱) : 풍사(風邪)와 열사(熱邪)가 겹친 것을 말한다. 풍열사가 몸에 침입하면 열이 심하고 오한은 약하며 기침과 갈증이 나고 혀가 붉어지며 약간 누런 설태가 끼고 맥박 상태가 부삭(浮數)한 증상이 나타난다. 심하면 입이 마르고 결막이 충혈되며 목구멍이 붓고 아프며 코피가 난다.
풍한(風寒) : 풍사(風邪)와 한사(寒邪)가 겹친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풍한사가 표(表)에 침범하면 위양(衛陽)을 상하기 때문에 바람을 싫어하고 오한이 나면서 열이 나고 머리와 온 몸이 아프며 코가 막히고 기침과 재채기가 나며 혀에 흰 설태가 끼고 맥박 상태가 부(浮)한 증상이 나타난다.
풍허(風虛) : 몸이 허해져서 생기는 풍증
하원불고(下元不固) : 신기불고(腎氣不固)의 다른 이름.
신기불고(腎氣不固) : 달리 하원불고(下元不固)라고도 일컬음. 신기(腎氣)가 튼튼하지 못한 것. 신기가 허약해져서 정(精)을 간직하고 소변을 통솔하는 기능이 장애된 것을 말한다. 신기불고되면 유정(遺精), 활정(滑精), 조루, 유뇨증, 야뇨증 등 병증이 생긴다. 신기를 보하고 고삽(固澀)하는 방법으로 치료하는 데 병증상에 따라 금쇄고정환(金鎖固精丸)이나 축천환(縮泉丸) 등을 쓴다.
하초(下焦) : 삼초(三焦)의 하나. 삼초의 하부를 말한다. 배꼽[또는 유문(幽門)]에서 전음(前陰) · 후음(後陰)까지의 부위에 해당한다. 하초에는 간(肝) · 신(腎) · 대장 · 소장 · 방광 등이 속하여 있기 때문에 하초의 주요 기능은 간 · 신 · 소장 · 대장 · 방광의 기능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즉 대소변이 잘 나오게 하고 대사 과정에서 생긴 쓸모 없는 물질을 대소변을 통하여 몸 밖으로 내보내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하초의 기능이 장애 되면 주로 설사와 배뇨 장애 증상들이 나타난다.
한담(寒痰) : 달리 냉담(冷痰)이라고도 함. 담음(痰飮)의 하나. 본래 담(痰)이 있는데다 한사(寒邪)를 받거나 비신(脾腎)의 양기가 허하고 한습사(寒濕邪)가 성해서 생긴다. 한사를 받았을 때에는 멀건 흰가래가 나오고 숨이 차며 기침이 나고 목이 가렵다. 때로 오한이 나면서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다. 폐(肺)를 따뜻하게 하고 담(痰)을 삭이는 방법으로 온폐탕(溫肺湯)을 쓴다. 비신의 양기가 허하고 한습사가 성할 때는 다리와 무릎에 맥이 없고 나른하며 등허리가 뻣뻣하고 아프며 관절이 시리고 저리다. 비신을 따뜻하게 하고 찬 기운을 없애며 담을 삭이는 방법으로 온중화담환(溫中化痰丸)이나 온위화담환(溫胃化痰丸)을 쓴다.
한사(寒邪) : 육음(六淫)의 하나. 추위나 찬 기운이 병을 일으키는 사기로 된 것을 말한다. 음사(陰邪)에 속하는데 양기를 쉽게 상하고 기와 혈액 순환을 장애한다. 몸에 한사가 침입하면 양기가 쉽게 상하고 기와 혈액 순환이 장애되어 아픈 증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몸의 양기가 부족하고 위기(衛氣)가 튼튼하지 못하면 한사가 쉽게 침입하여 한증(寒證)을 일으킨다. 한사에 의하여 생긴 병증 때의 일반 증상은 오싹오싹 추우면서 열이 나고 몸통 · 관절 ·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나는 것이다.
한열(寒熱) : 오한, 발열 증상을 합해서 말함.
한증과 열증. 음양이 치우쳐 성하거나 약해져 생김. 양이 이기면 열이 나고, 음이 이기면 한(寒)이 생겨 음양성쇠(陰陽盛衰)가 구체적으로 나타남. 한(寒)과 열(熱)은 상대적(相對的)이고, 상호간(相互間)에 관련(關聯)한다. 때로는 진한가열(때로는眞寒假熱), 진열가한(眞熱假寒),혹은 한열착잡(寒熱錯雜)의 증상(症狀)을 나타낸다.
한음(寒淫) : 육음(六淫)의 하나. 찬 기운이 지나치게 성하여 병인으로 된 것을 말한다. 한사(寒邪)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해독소종(解毒消腫) : 해독(解毒)하여서 피부에 발생된 옹저(癰疽)나 상처가 부은 것을 삭아 없어지게 하는 효능.
해서(解暑) : 더위 먹은 것을 풀어주는 효능.
해열제번(解熱除煩) : 열을 내리고 가슴이 답답한 것을 없애주는 효능
행기소간(行氣疏肝) : 기를 잘 돌게 하고 간기(肝氣)가 정체된 것을 흩어지게 하는 방법이다. 간기가 정체되어 양쪽 옆구리가 뻐근하면서 아프거나 쑤시는 것 같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며 때로 메스껍고 토하며 식욕이 부진하고 설사하면서 온 몸이 거북하고 불편하며 맥박 상태가 현(弦)한 증상이 나타날 때에 소간법으로 시호소간산(柴胡疎肝散)이나 칠기탕(七氣湯)을 쓴다.
행기통락(行氣通絡) : 인체에서 경맥은 모든 부위에 분포되며 장부와 연결되며 피부뿐 아니라 근육, 골격에도 분포한다. 정상인이라면 기혈은 경락 중에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지만 풍한서습(風寒暑濕) 등의 요인으로 기혈이 정체되고 경락이 막히면 붓고 아프거나 일련의 기능 장애가 일어난다. 이러한 부위에 뜸을 뜨면 다시 경락이 통하게 되고 잃었던 기능을 되찾게 된다.
행혈(行血) : 치료법의 하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방법으로서, 주로 어혈증(瘀血證)에 적용함.
허열(虛熱) : 허해서 나는 열. 음(陰) · 양(陽) · 기(氣) · 혈(血)이 부족해져서 나는 열을 말한다. 실열(實熱)에 상대되는 열이다. 허열은 많은 경우 음이나 혈이 허하여 생기는 데 양이나 기가 허해서 생기는 때도 있다. 허열이 날 때는 반드시 해당 허증(虛證) 증상들이 겸해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기허(氣虛) · 혈허(血虛) · 음허(陰虛) · 양허(陽虛) 등 어느 허증으로 생긴 허열인가를 가려서 치료한다.
허한(虛寒) : 정기가 허하고 속이 찬 증상.
허화(虛火) : 진음(眞陰)이 부족하여 생긴 화를 말한다. 실화(實火)에 상대되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허화는 음이 부족하여 생기기 때문에 허화가 있을 때는 음허(陰虛) 증상이 나타난다. 즉 양 볼이 벌게지고 미열이 나며 손발바닥이 달아오르고 가슴에 번열(煩熱)이 나면서 답답하고 수면 장애가 있으며 식은땀이 나고 입과 목구멍이 마르며 골증(骨蒸)과 노열(勞熱)이 있고 맥이 세삭(細數)하면서 힘이 없는 증상이 나타난다.
현훈(眩暈) : 뇌출혈로 인한 현기증.
현(眩)은 안목이 혼현(昏眩)함을 말하고, 훈(暈)은 두뇌의 훈전(暈轉)을 뜻한다. 본증(本證)은 외사(外邪)·칠정(七情)·신허(賢虛)·혈허(血虛)가 원인이다. 두훈(頭暈)으로 인해 안혼(眼昏)이 되는 것은 전현이라 하고, 안혼으로 인해 두훈이 되는 것은 목현(目眩)이라 한다. 머리가 어지러우며 무겁고, 눈이 흐려지는 것을 현모(眩冒)라 한다.
대개 체허(體虛)·간풍(肝風)·담기(痰氣)·정신자극 등의 요인이 관계되며, 임상상허증과 실증(實證)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허증이 많다. 허증은 대개 간신음허(肝腎陰虛) 또는 기혈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다.
간신음허에 속하는 경우는 두목혼현(頭目昏眩)·정신부진(精神不振)
·유정이명(遺精耳鳴)·기증(氣症) 등을 나타낸다. 심비양허(心脾兩虛)에 속하는 경우는 심계실면(心悸矢眠)·체권(體倦)·소식(少食)·
면색백(面色白)·순색담백(脣色淡白)·기증 등을 나타낸다. 실증은 대개 간풍상요(肝風上擾)로 인해 생기며, 조색이로(躁色易怒)·실면다몽(矢眠多夢)·
구고(口苦)·두중(頭重)·다담(多痰)·흉민오심(胸悶惡心) 등의 증을 나타낸다.
혈리(血痢) : 달리 적리(赤痢)라고도 부름. 이질의 하나. 피가 섞인 대변을 누거나 순 피만 누는 이질을 말한다. 열독(熱毒)이 대장에 몰려 혈락(血絡)을 상해서 생긴다. 열이 나면서 배가 몹시 아프고 뒤가 무직하며 대변량은 적고 신선한 피가 섞여 나오거나 순 피만 눈다. 혈리가 오래 되어 중기(中氣)가 허한(虛寒)해지면 대변의 피색이 어두운 잿빛 같이 되고 얼굴은 누러면서 윤기가 없으며 맥은 약하다.
급성기에는 대장의 열독을 없애는 방법으로 백두옹탕(白頭翁湯)을 쓰고 피가 멎지 않으면 황련아교탕[黃連阿膠湯: 황련(黃連) · 황금(黃芩) · 아교(阿膠) · 적작약(赤芍藥) · 계자황(雞子黃)] 에 천화분(天花粉) · 생지황(生地黃) · 당귀(當歸) · 지유(地楡) 등을 더 넣어 쓴다. 만성 때에는 온비섭혈(溫脾攝血)하는 방법으로 황토탕[黃土湯: 감초(甘草) · 건지황(乾地黃) · 백출(白朮) · 포부자(炮附子) · 아교(阿膠) · 황금(黃芩) · 황토(黃土)]을 쓴다.
협늑작통(脇肋灼痛) : 갈비, 겨드랑이 통증
화비(和脾) : 비장(脾臟)의 기능을 정상으로 만드는 효능
활혈(活血) : 이혈법(理血法)의 하나. 혈액 순환을 촉진하는 방법이다. 주로 어혈증(瘀血證)에 쓴다. 약으로는 단삼(丹參) · 홍화(紅花) · 도인(桃仁) · 천궁(川芎) · 당귀(當歸) · 우슬(牛膝) 등을 쓴다. 임상에서 활혈약(活血藥)을 쓸 때는 흔히 행기약(行氣藥)을 섞어서 쓰는데 그것은 기가 잘 돌아가야 혈액 순환도 잘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부정자궁출혈과 자궁루혈(metrorrhagia and metrostaxis), 혈허증(血虛證) 환자와 임신부에게는 활혈법을 쓰지 않는다.
활혈통경(活血通經) : 이혈법(理血法)*의 하나. 활혈약(活血藥)으로 경폐증(經閉症)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경폐증의 원인에 따라 치료를 달리하는 데 기허(氣虛)로 생긴 경폐증 때에는 보기약(補氣藥)을 위주로 쓰고 혈허(血虛)로 생긴 경폐증 때에는 보혈약(補血藥)을 위주로 쓰면서 활혈약인 단삼(丹參) · 홍화(紅花) · 도인(桃仁) · 천궁(川芎) · 당귀(當歸) · 우슬(牛膝) 등을 같이 쓴다.
↪ 이혈법(理血法) : 치료법의 하나. 혈분의 병 또는 혈병을 치료하는 방법. 이혈에는 보혈(補血), 양혈(養血), 온혈(溫血), 거어활혈(去瘀活血), 지혈(止血) 등 5가지가 포함됨.
회유(回乳) : 소유(消乳)의 다른 이름. 약물을 써서 젖이 분비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다.
효천(哮喘) : 효증(哮證)과 천증(喘證)이 합쳐 나타나는 병증. 흔히 폐기(肺氣)가 장애되거나 신(腎)의 납기(納氣) 작용의 장애로 생긴다. 효와 천은 서로 인과 관계를 가지고 생기는 수가 많으며 이들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구별되는 점이 있다. 《동의보감(東醫寶鑑)》에 효증은 목구멍에서 가래가 막혀 가래 끓은 소리가 나면서 숨이 찬 것이고 천증은 주로 숨만 몹시 찬 것이라고 하였다. 효는 발작적인 숨가쁨과 가래 끓은 소리가 나는 것인데 대체로 갑자기 생기는 수가 많다. 천은 숨가쁨이 위주인데 숨결이 밭으며 입을 벌리고 어깨를 들먹거리며 몸이 흔들리고 때로 배까지 들썩거린다. 일반 치료 원칙은 발작 전이면 정기를 보해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이미 발작하였으면 원인을 없애는 데 기본을 둔다.
효증(哮證)이 발작할 때 늘 숨찬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좁은 의미에서 효증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흉비(胸痹) : 가슴이 막히는 듯하면서 아픈 것을 위주로 하는 병증. 습담(濕痰), 어혈 등 음사(陰邪)가 가슴에 몰려서 양기가 제대로 돌지 못하거나 맥락이 통하지 못해서 생긴다. 가슴이 벅차고 답답하며 아픈 데 심하면 아픔이 잔등에까지 퍼지고 숨이 가쁘며 편안히 눕지 못한다. 담(痰)을 삭이고 기의 순환을 촉진하며 속을 따뜻하게 하고 아픔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과루해백백주탕(瓜蔞薤白白酒湯) · 과루해백반하탕(瓜蔞薤白半夏湯) 등을 쓴다.